다락방의 미친 여자 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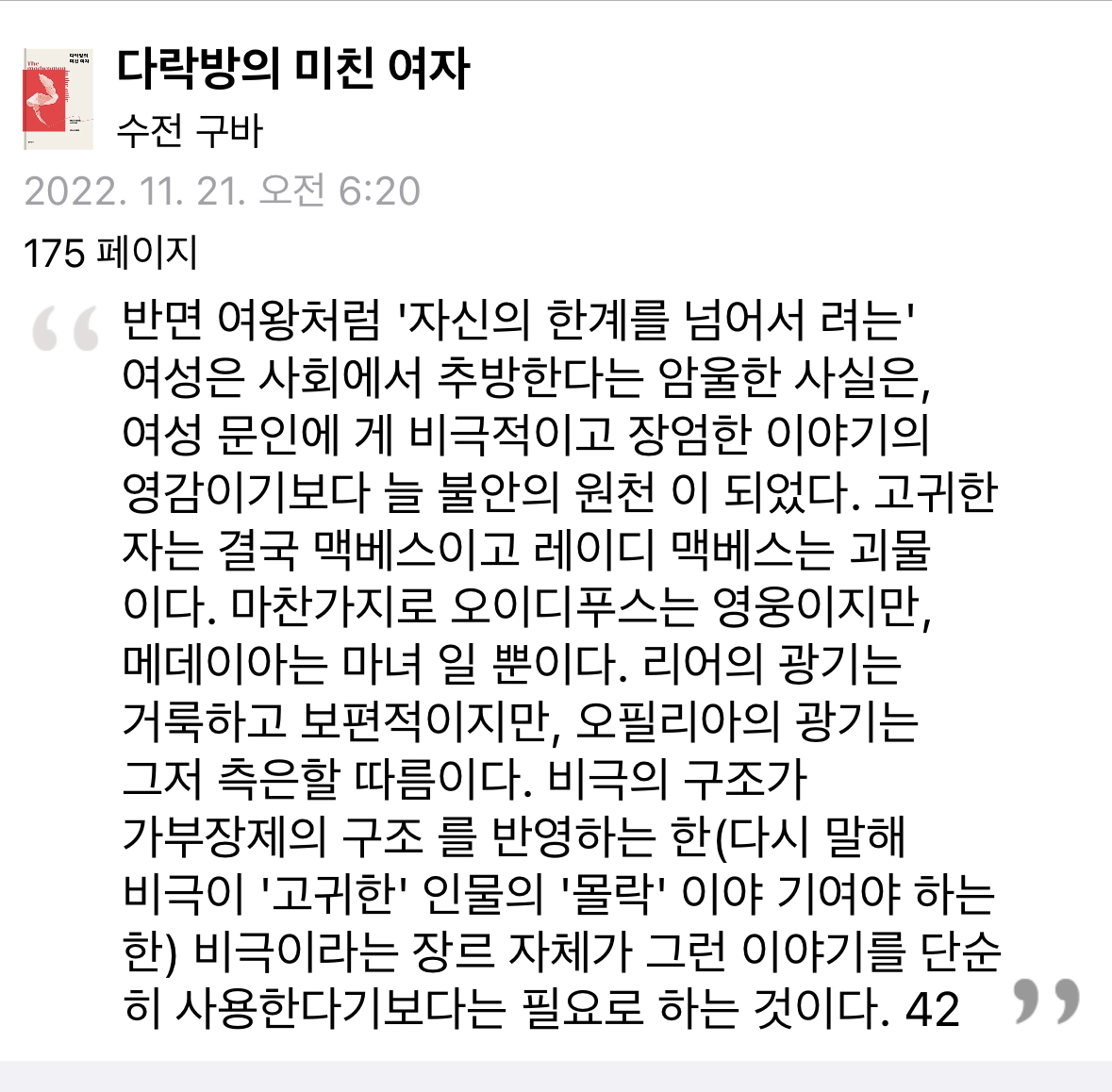
다락방의 미친 여자 2장
감염된 문장
여성 작가와 작가가 된다는 것에 대한 불안
1장에 이어 여성 작가가 왜 불안했는지 그 배경과 이유를 살펴본다. 제목은 에밀리 디킨슨의 시
“감염된 문장은 새끼를 친다”에서 따왔다. 1장에 나온 여성의 이미지가 천사와 괴물, 공주와 광적인 여왕 대립 뿐이라면
여성이 글을 쓰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성 작가는 왕처럼 들리게 할까? 왕에게 응수할까? 물음을 던진다. 최초이자 최고의 문학 심리사 연구가는 해럴드 블룸이다. 그는 문학사 모델을 남성적, 가부장적으로 봤다.
남성 선배들은 여성 작가가 자신의 작가로 정체화하는 방식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여성 작가에게 작가가 되는 것의 불안으로 다가 온다.
그래서 선배 여성 작가를 찾는 과정에서 감염과 쇠약을 발견하지만 작가는 여성 작가는 ‘여성적 힘’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잃어버린 문학적 모계를 찾기 위해서는 그 힘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좀 의문이 들었지만 남성 선배를 따라가는 게 아닌 절망 속에서도 자신 내부에서 힘을 찾아야 한다는 정도로 이해했다.
여성의 질병 이야기가 나온다.
히스테리, 거식증, 광장공포증 등. 이런 질병은 가부장적 사회화에 기인한다.
여성적인 것은 무자비한 자기 억제, 이야기를 갖지 못하는 삶. 앤 섹스턴의 시에 나오는 빨간 구두.
이 부분을 읽으며 안데르센의 빨간 구두 동화도 생각났다.
구두를 신고 죽음의 춤을 춰야 하는 소녀들. 그래야지만 벗어날 수 있었던 그 시대. “펜조차 여성에게 힘을 주지 못한다. 힘을 박탈당한 여성들은, 도리스 레싱의 여자 주인공들처럼, 자신이 될 수도 있었던 무언가를 희미하게라도 기억해내기 위해 내면화된 가부방적 비난과
싸워야 했다” p.160
다음 장은 펜을 든 여성들이 받았던 평가들이다.
우울의 여왕 (핀치) , 소일거리, 수상한 여자…
여성 문인은 필명이나 익명 출판, 아니면 겸손하게 여성으로 한계를 고백, 더 하찮은 주제에 집중해야 했다.
여성작가들은 자신을 남자로 분장, 이름을 바꾸고 여자라는 문학적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조르주 상드에 대한 엘리자베스 배럿 브라우닝의 소네트 - 상드가 사실상 죽음 속에서만 젠더의 속박을 초월할 수 있을 거라 선언
그렇다면 여성 작가는 불안을 극복하려고 어떤 전략을 개발했을까?
첫째, 많은 여성 문인이 여성의 겸손함이나 남성 흉내를 벗어버리고 뛰어넘어 성장했다.
둘째, 우리가 가부장적 시학이라고 부르는 기준에 따라 전적으로 남성적인 문학사와 관련해서 볼 때, 이들 여성의 작품은 종종 이상해 보인다.
에밀리 디킨슨 “모든 진실을 말하되, 비스듬히 말하라” 외관은 표면의 무늬가 훨씬 깊고 접근하기 어려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더 어려운) 층위의 의미를 감추거나 흐려 놓았다. p.183
앤 브론테 소설 ‘와일드펠 홀의 거주인’- 기독교 가치를 얘기한다고 하지만 사실 여성 해방 이야기다. “예술의 외관 뒤에 숨는다는 것은 여전히 숨기는 것이고 제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
그래서 여성 작가 작품에 나오는 집, 유령의 방, 무덤 과 동굴 등은 감금의 이미지.
길먼 소설 ‘누런 벽지’ - 다락방 펜과 종이 금지, 아내를 가둠. 하지만 화자는 누런 벽지 사이와 뒤를 기어다닌다.
이 점은 여자가 자신의 몸이라는 ‘감염된’집에 갇히는 형을 받았을 때 조차 (70년 후 실비아 플라스가 말했던 것처럼) ‘회복한 자아, 여왕’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작가는 말한다.